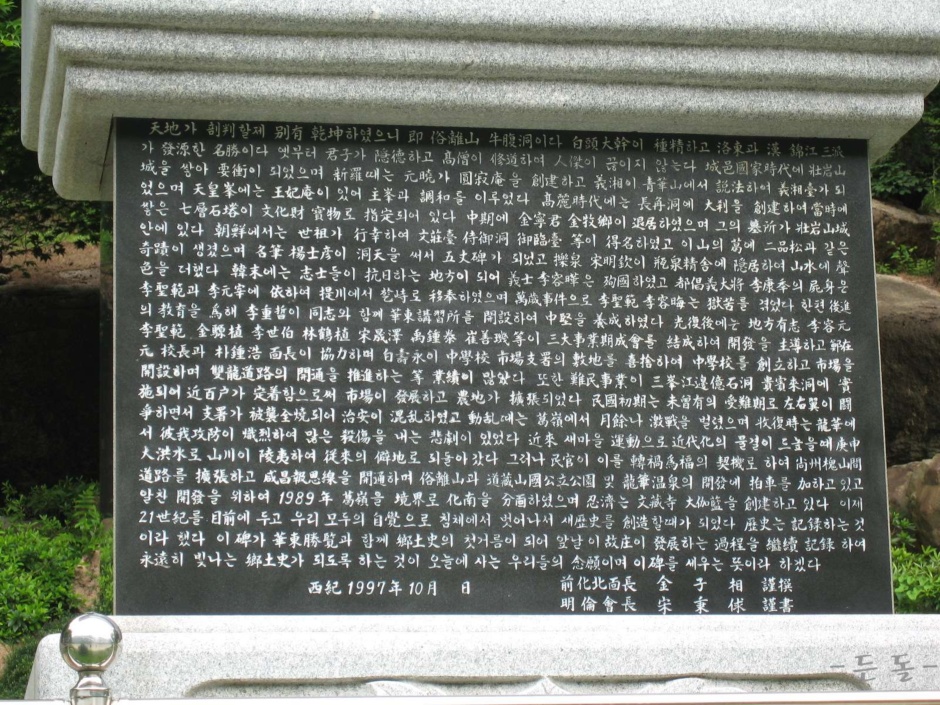화북에서 농암 방향으로 32번 국도를 타고 승무산과 도장산 사이로 1㎞ 들어가면 ‘우복동 애향공원’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폭 3~4m에 비스듬히 누운 동천바위가 있는데, 바위 표면에 초서체로 ‘洞天’이란 글씨가 날아갈 듯 새겨져 있다.
글은 조선 명종 때의 문장가 양사언이 썼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도장산 심원사에 도를 닦던 개운조사의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우복동(牛腹洞)은 예로부터 영남 일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승지로 상주 속리산 동편에 숨어 있다고 전해진다. 동네가 마치 소의 배 안처럼 생겨 사람 살기에 더없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백성들은 물론 몰락한 양반의 후예들도 우복동을 찾아 떠나기도 했다. 이 사실은 정약용의 <다신시문집> 제18권 ‘증언(贈言)- 다산이 제생(諸生)에게 주는 말’에 기록되어 있다.
근세에 고가(故家) 후예로서 먼 지방으로 영락(零落)되어 와서 사는 사람들은 영달(榮達)할 뜻은 없이 오직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 심한 경우는 새처럼 높이 날아가고 짐승처럼 멀리 달아나려고 하여 우복동(牛腹洞)만 찾고 있는데,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손들이 노루나 토끼가 되어버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우복동의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시로 남겼다.
그는 세상을 이롭게 할 생각 없이 오직 자신의 목숨 부지에만 연연하는 선비를 ‘멍청한 선비’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약용은 유토피아 우복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느라 헛고생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개혁하여 살기 좋게 만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속리산 동편에 항아리 같은 산이 있어
옛날부터 그 속에 우복동이 있단다네
산봉우리 시냇물이 천 겹 백 겹 둘러싸서
출입문은 대롱만큼 작디작은 구멍 하난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해와 달 빛이 나고
기름진 땅 솟는 샘물 농사짓기 알맞아서
멍청한 선비 그를 두고 마음이 솔깃하여
지레 가서 두어 마지기 밭이라도 차지하려고
죽장망훼 차림으로 그곳 찾아 훌쩍 떠나
백 바퀴나 산을 돌다 지치고 쓰러졌다네
적이 쳐들어와도 나라 위해 죽어야지
너희들 처자 데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아내가 방아찧어 나라 세금 바치게 해야지
아아 세상에 어디 우복동이 있을 것인가
- 정약용 ‘우복동가(牛腹洞歌)’ 중에서
정약용이 생각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헐벗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현실 개혁에 함께 나아가자는 것은 무리였다.
이미 수많은 백성이 우복동을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질긴 뿌리를 내렸다. 그곳은 속리산 동편,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일대였다.
이중환이 청화산을 사랑한 이유는?
화북면은 용유리와 장암리, 내서리 화산마을 일대, 용화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들에게 우복동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우복동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비결에 따라 이주하여 자신이 사는 곳을 우복동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화북면은 형제봉~속리산(1057m)~청화산(984m)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와 청화산에서 가치 친 시루봉(876m)과 승무산(588m), 도장산(828m)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는 장소에 따라 소의 뱃속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옛 문헌에 의지하여 추리한다면 우복동은 내서리 광정마을과 화산마을(구화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복동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없다. <택리지>와 <연려실기술>에는 병천(甁川)과 용유동(龍游洞)에 대한 기록이 중복되어 나온다. ‘냇물은 청화산 남쪽을 돌아 동쪽 용추(龍湫)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병천이다. 이 내 남쪽의 도장산도 속리산의 한 지맥에 속하는데 청화산과 맞닿았고 두 산 사이와 용추 위를 통틀어 용유동이라 부른다.’ 이 기록은 마치 승지를 설명하는 것 같다. 따라서 병천과 용유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실증적인 증거는 남사고가 말한 ‘속리산 근처의 증항 부근’이라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증항(甑項)은 시루봉(시루목)을 말한다. 시루봉은 청화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산봉우리로 광정과 화산마을의 뒷산에 해당한다.
광정과 화산마을은 북쪽으로 청화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서쪽으로 시루봉이 봉곳하다.
그리고 남쪽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있는데, 이곳이 병천이다. 병천에는 쌍룡계곡이 흐르고 이 계곡에 유명한 용추가 있다. 남쪽으로는 도장산은 당당하지만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동쪽은 청화산에서 뻗어 내려온 승무산이 속리산의 화기(火氣)가 마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승무산은 무학대사가 이 산에 올라 주변 풍광이 너무 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어쩌면 무학대사는 기뻐한 것은 광정과 화산마을의 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편 이중환은 ‘청화산은 뒤에 내외(內外) 선유동을 두고, 앞에는 용유동을 임해 있다. 앞 뒤편의 경치가 지극히 좋음은 속리산보다 낫고, 산의 높고 큼은 비록 속리산에 미치지 못하나 속리산같이 험준한 곳이 없다. 흙봉우리에 둘린 돌이 모두 수려하고 살기가 적고 모양이 단정하고 평평하여, 수기(秀氣)가 흩어져 드러남을 가리지 않아, 자못 복지(福地)다’라 했다. 이 말은 청화산이 우복동 마을을 넉넉하게 품고 있고, 동쪽으로 시루봉을 세워 마을에 굶주림을 막아주고, 남쪽 승무산으로 발을 뻗어 속리산의 화기를 막아주는 점까지 감안했던 것은 아닐까.
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나는 우복동
“6.25 난리 때 강원도에서 이곳으로 왔어. 영감이 비결을 보고 우복동을 찾아가자고 했지. 마을의 비결파 영감들은 모두 죽었어. 나만 남았지. 한 50호가 화전 붙이고 아들 딸 키우며 잘 살았지.
이곳은 해가 길어 농사짓기도 좋아. 그뿐이야. 물 좋지, 공기 좋지. 한 3년 됐나. 마을 빈집에 곧 죽게 생긴 젊은이가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는 멀쩡해.”
마을 내력을 들려준 화산마을에 이희재(90) 할머니 집 툇마루 앉으니 주변 산들에 안긴 것 같아 편안했다.
할머니가 집 마당에서 떠준 물은 시원하고 달콤했다. 청화산에서 내려오는 산삼 썩은 물이라고 했다.
최근 우복동 화산마을은 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느티골 넓은 공터에 자리 잡은 길재홍·유선희씨의 흙집 ‘청화산방’ 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이 마을로 귀농한 20여 명이 토박이 부부에게 배우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상사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전에 이곳으로 귀농한 조석동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좋아하던 산과 더불어 흙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이상적인 도농결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농사는 전부 유기농으로 짓고 있다. 고향 없는 도시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와 자기 고향처럼 쉬고, 농약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청화산방’의 밤은 놀라웠다. 마당 주변을 둥그렇게 에워싼 청화산 줄기는 시커먼 빛을 토해냈고, 검은 산 위로 별무리가 그득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어둠과 초롱초롱한 별들을 만났다.
우복동의 밤은 편안했고, 그날 밤 깊은 단잠에 빠졌다.